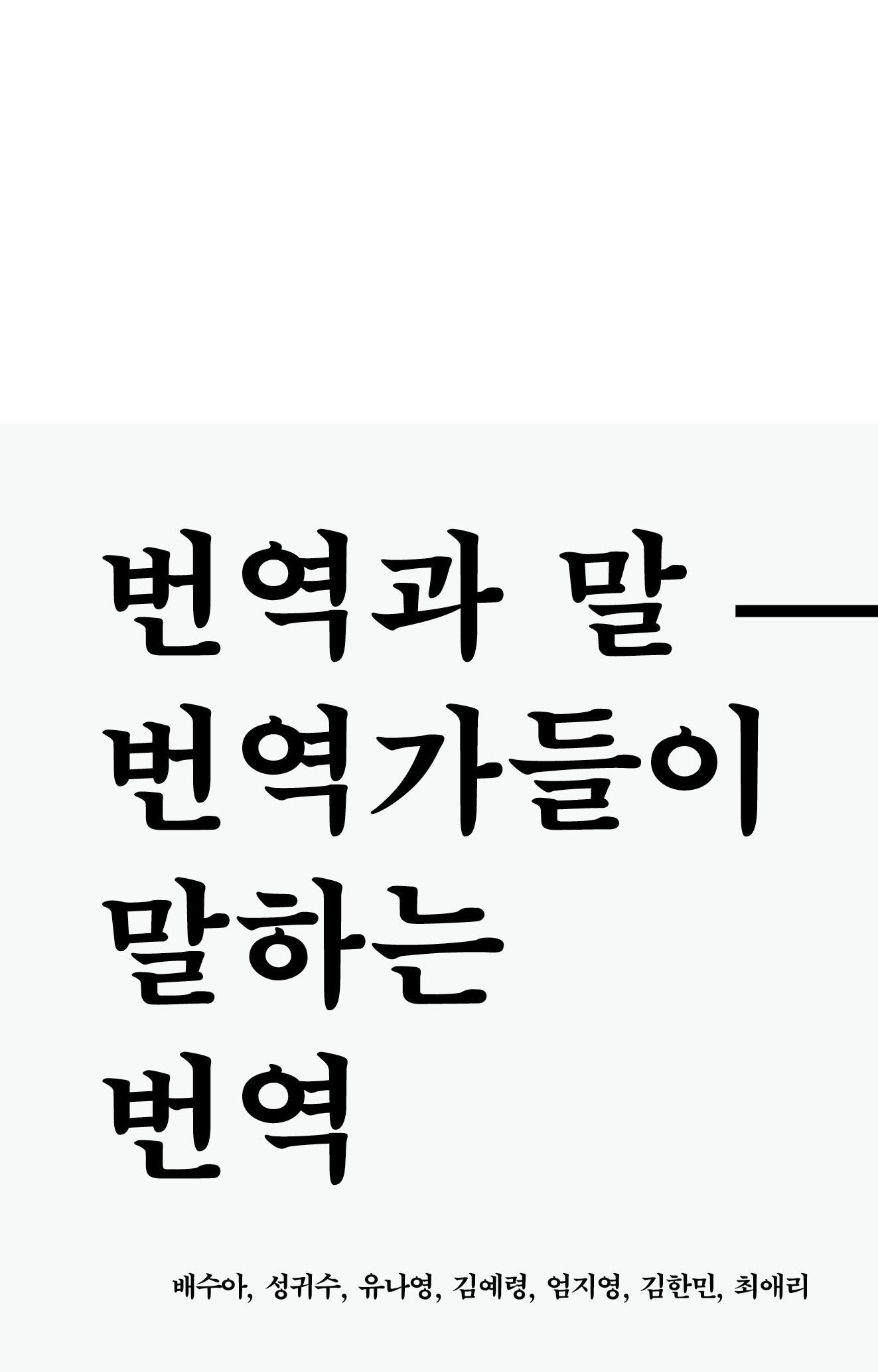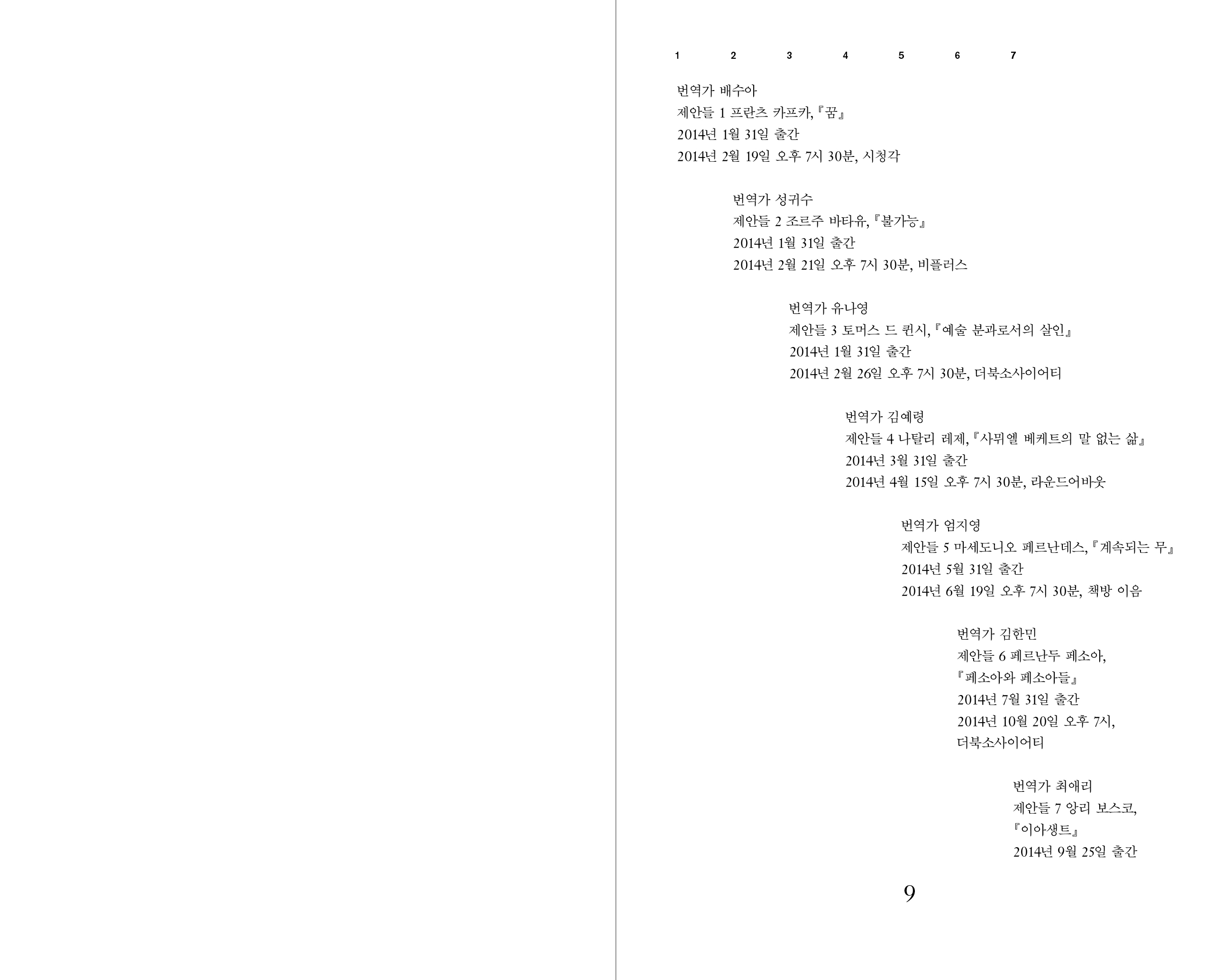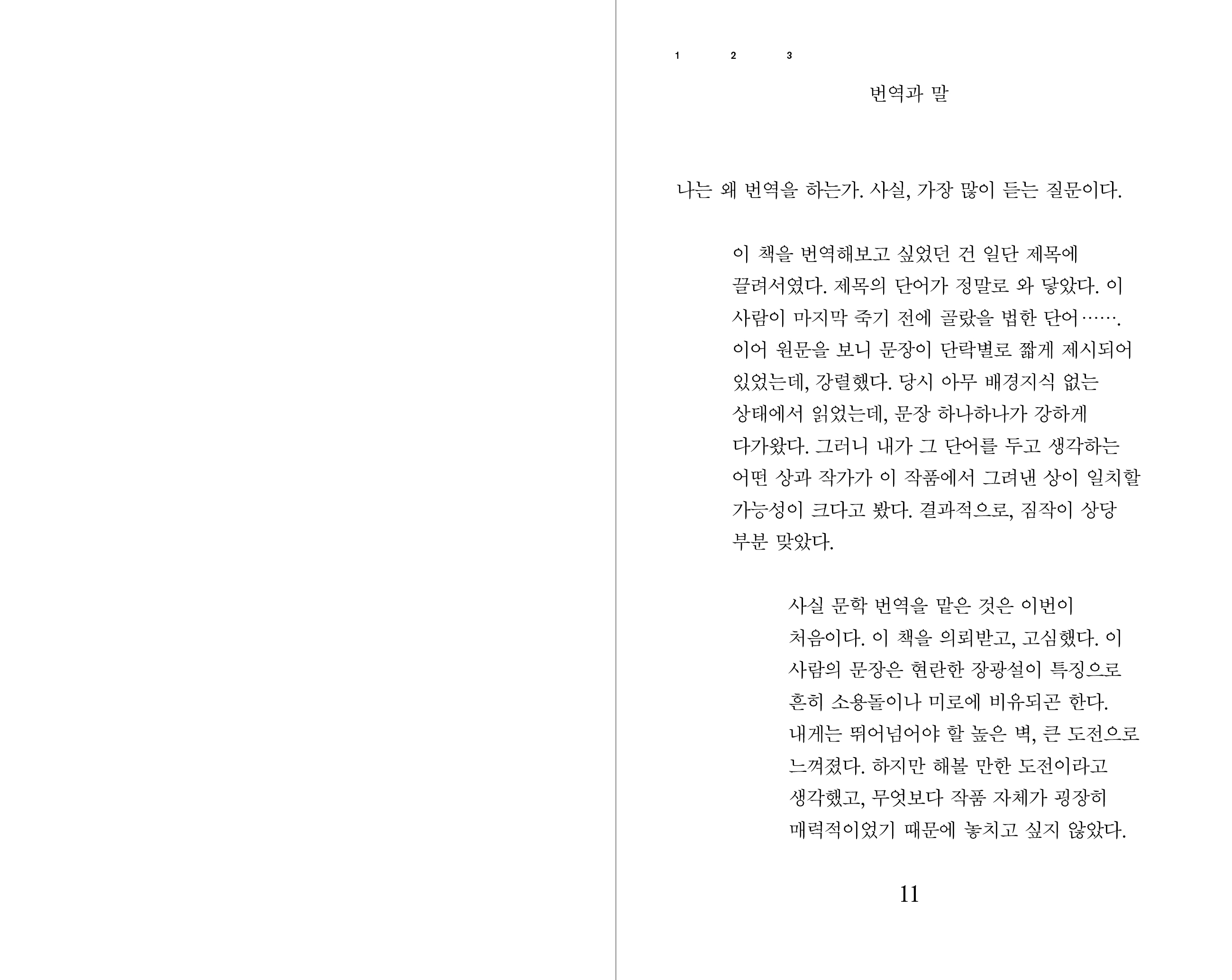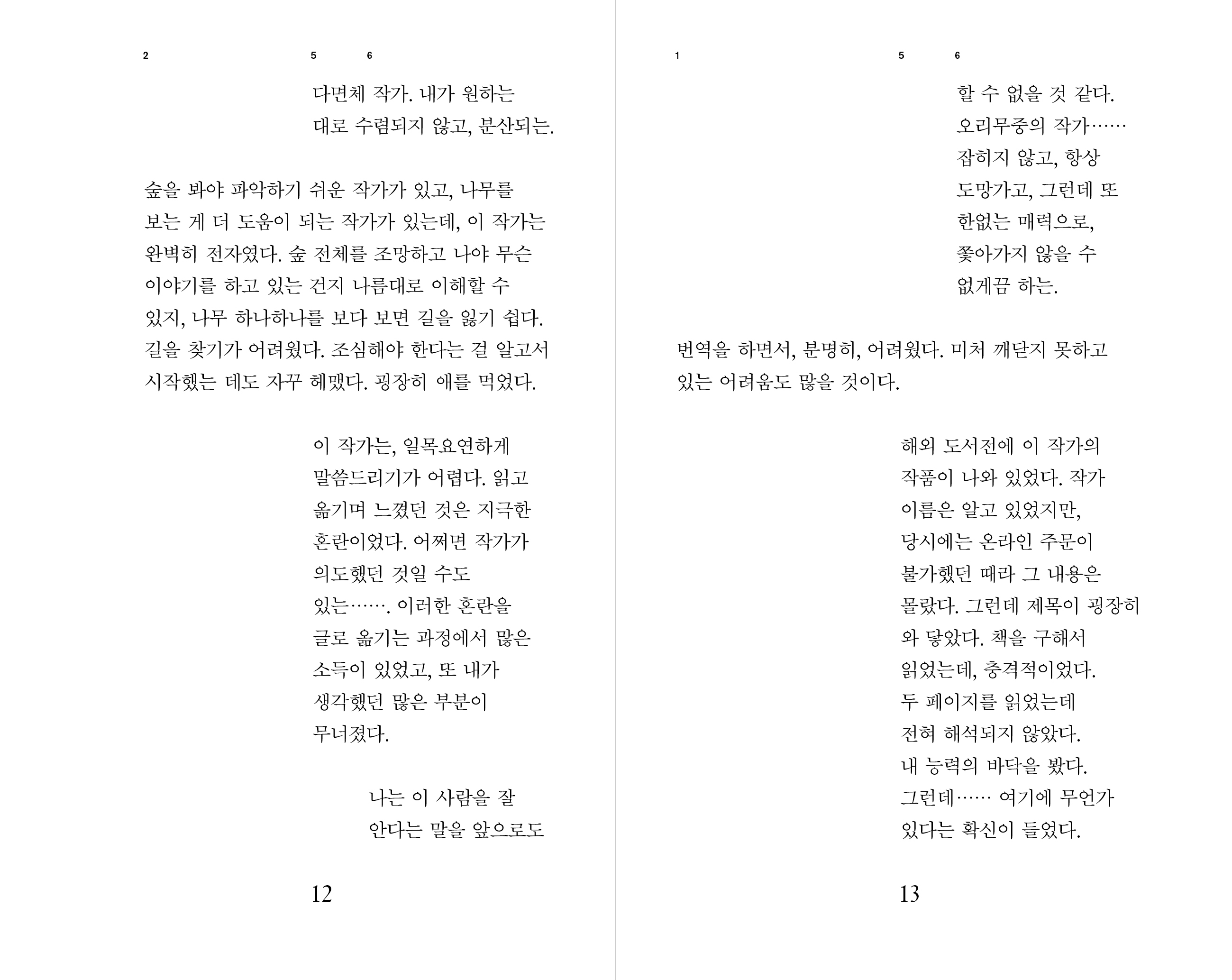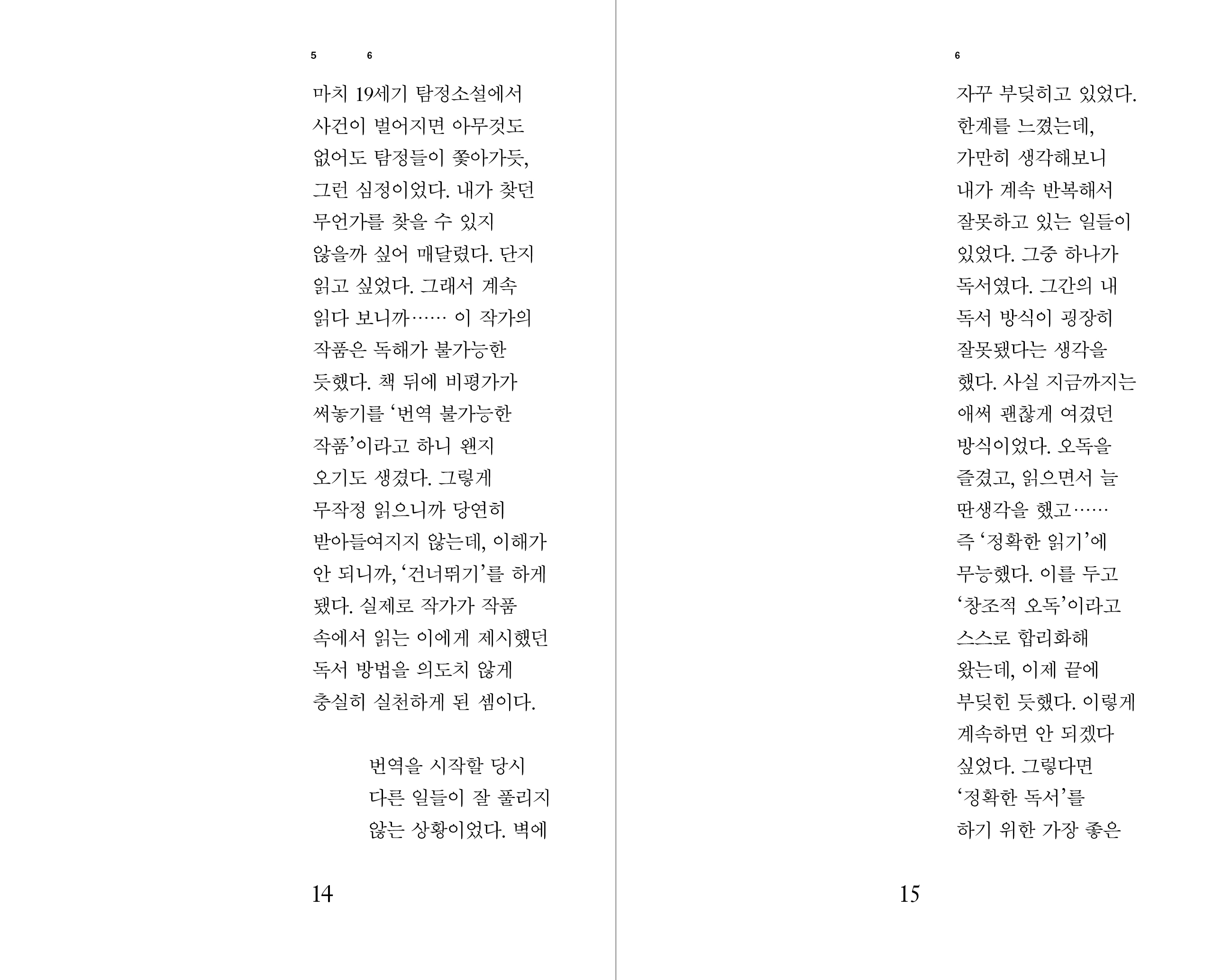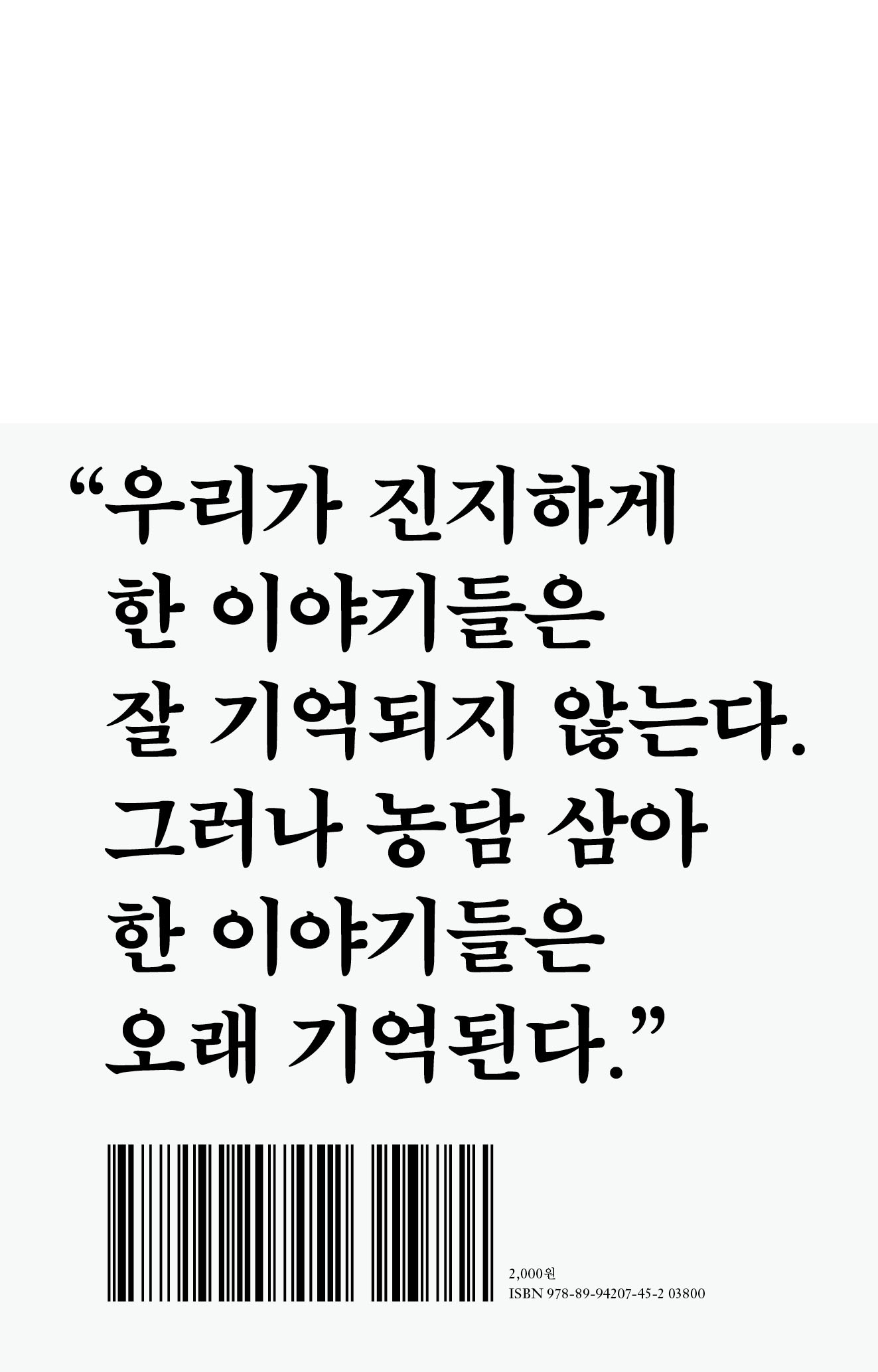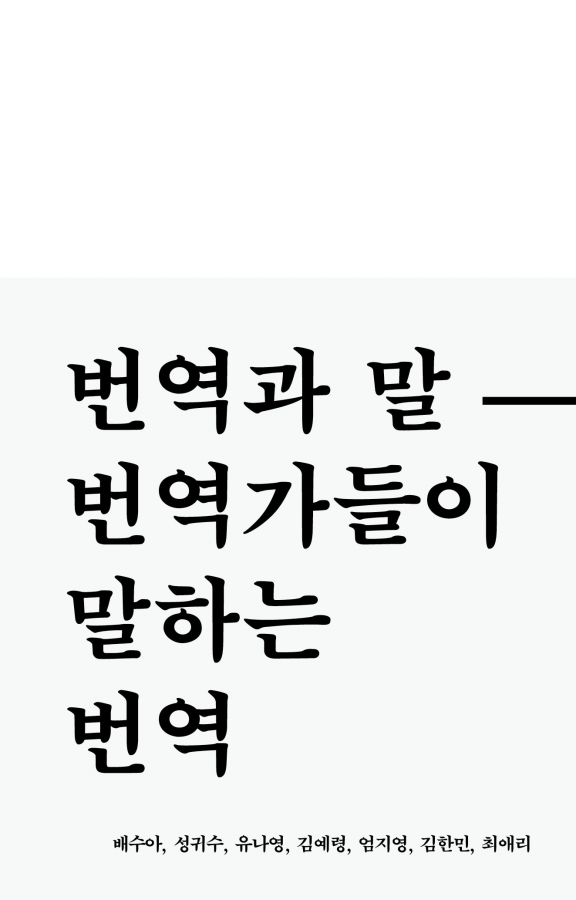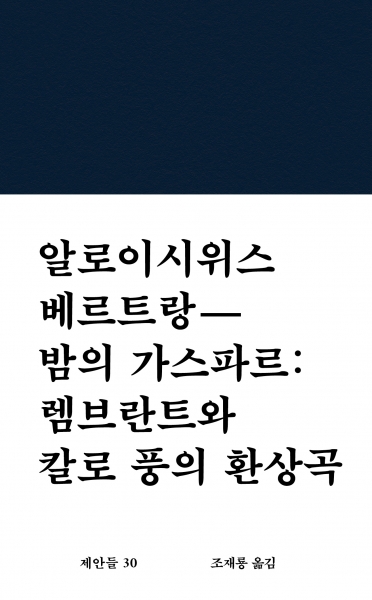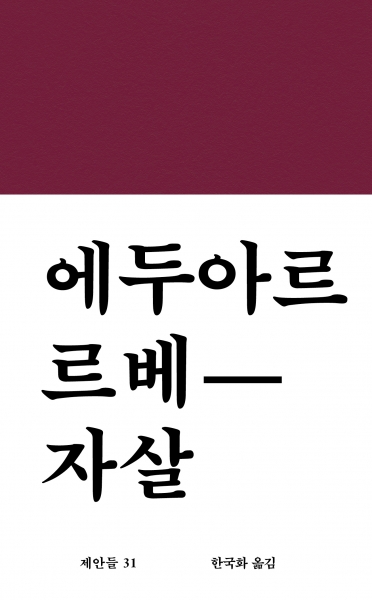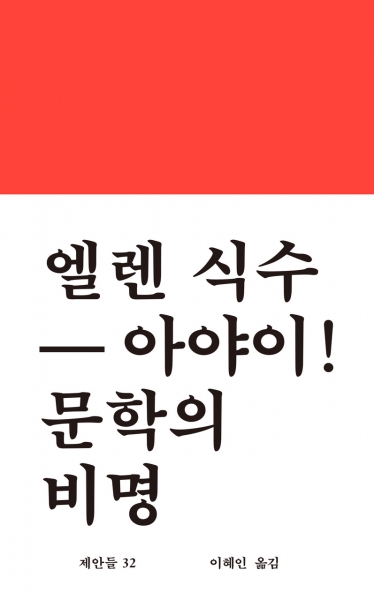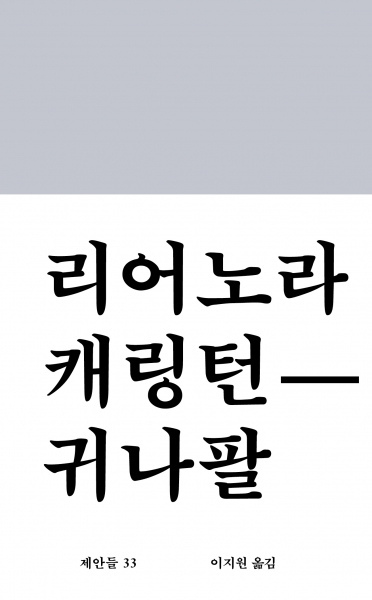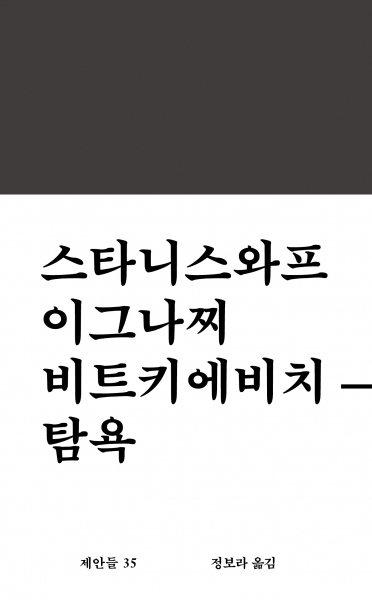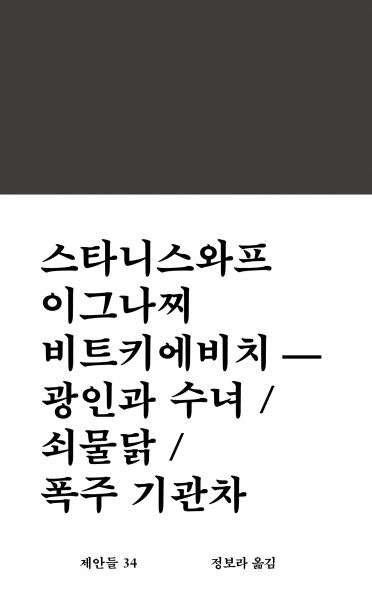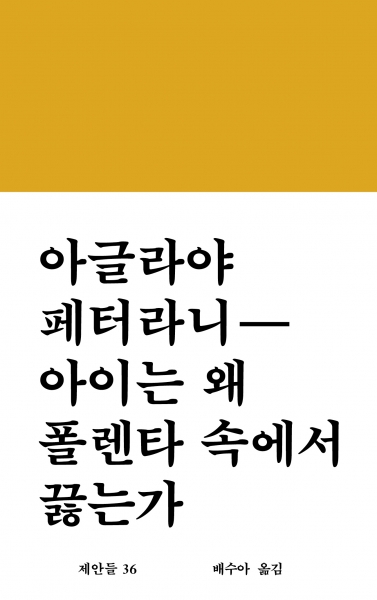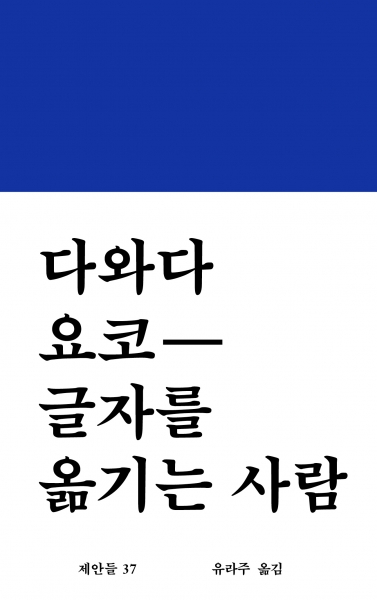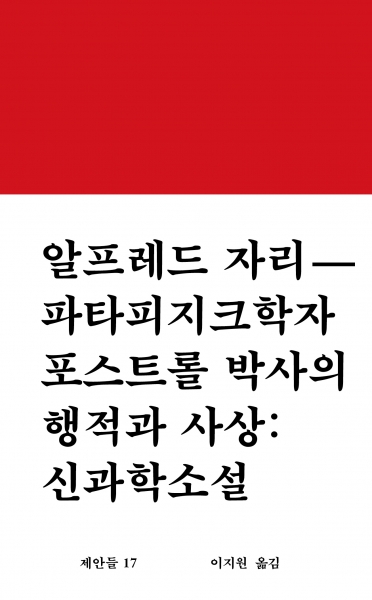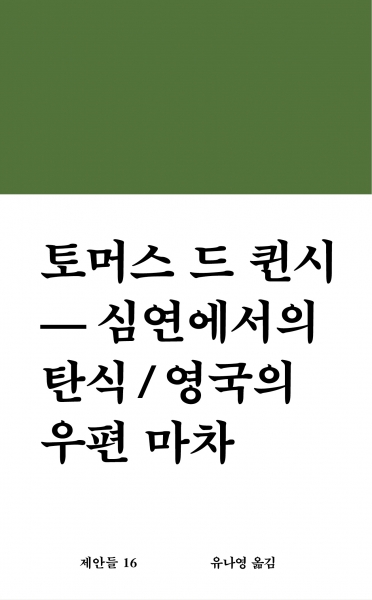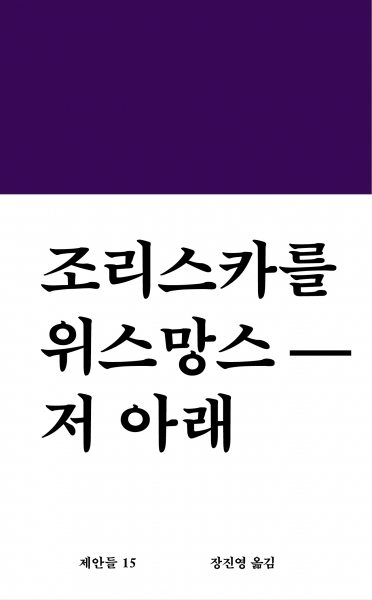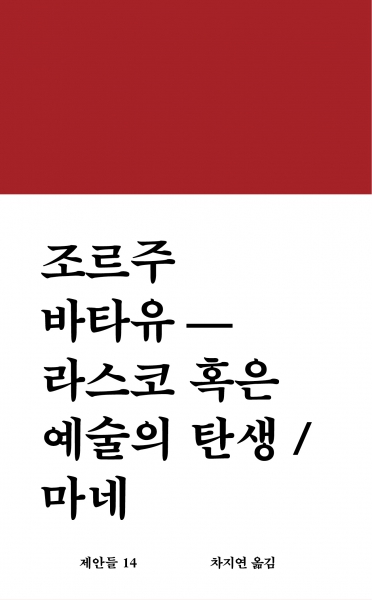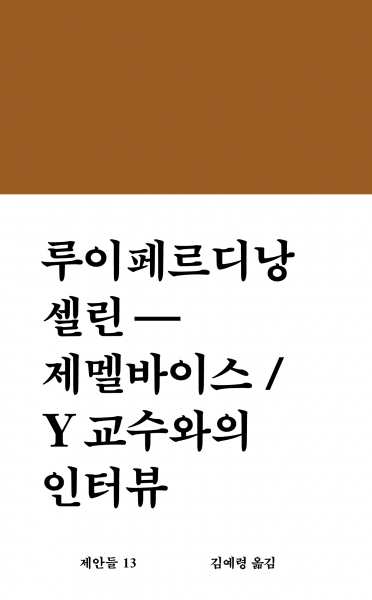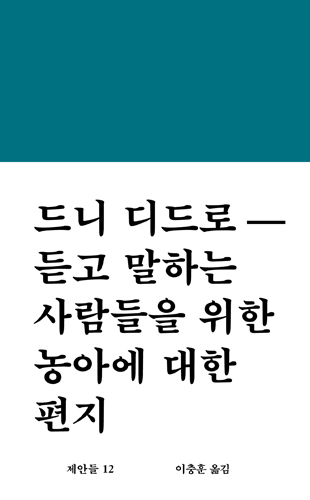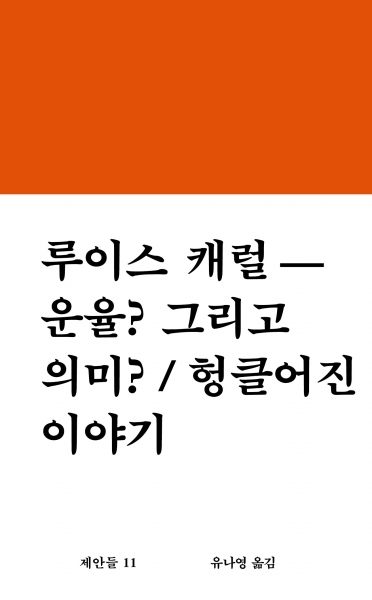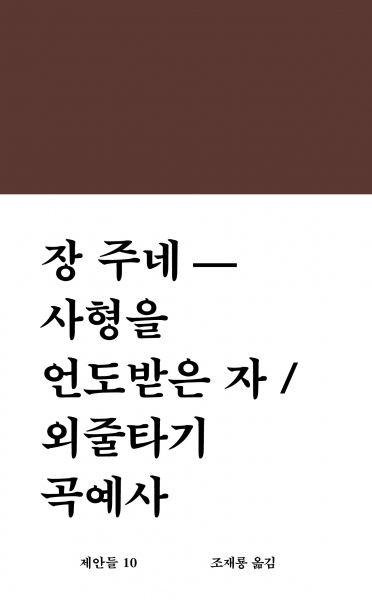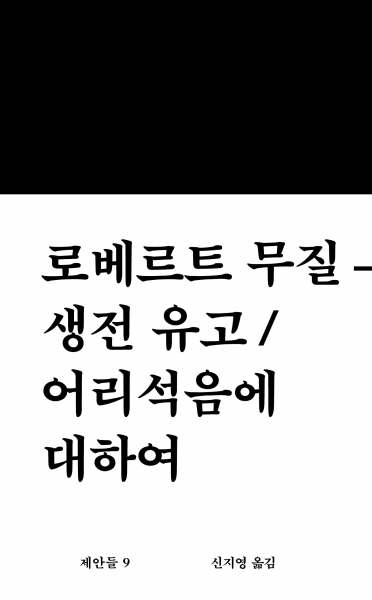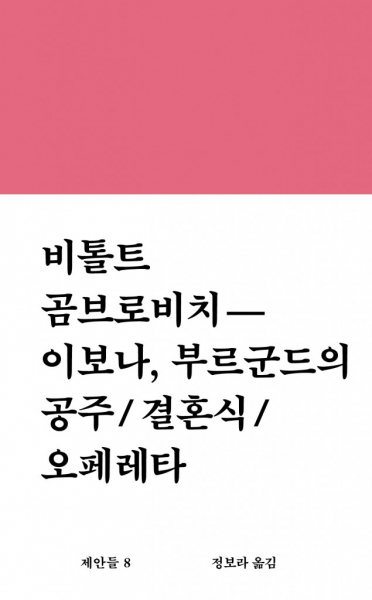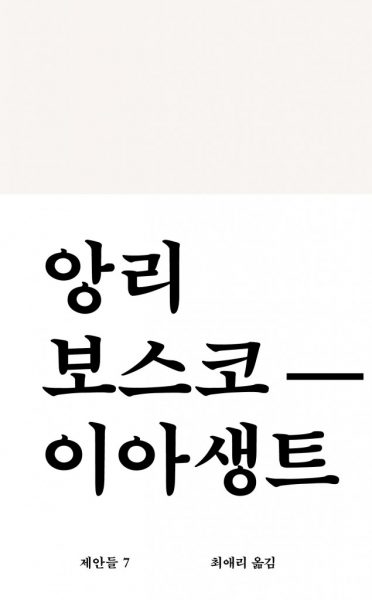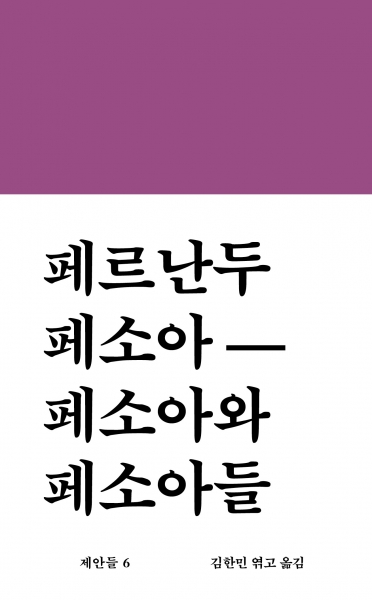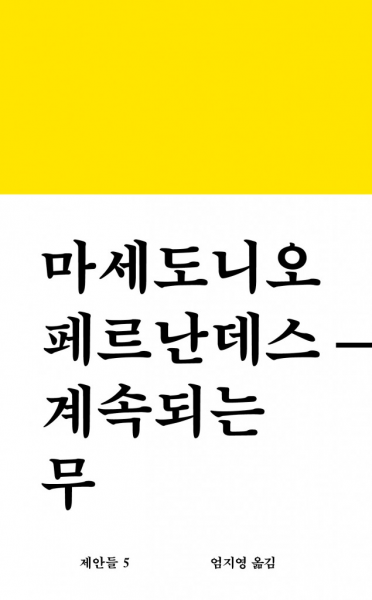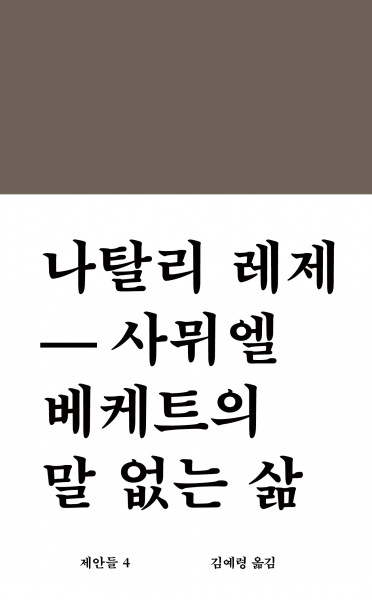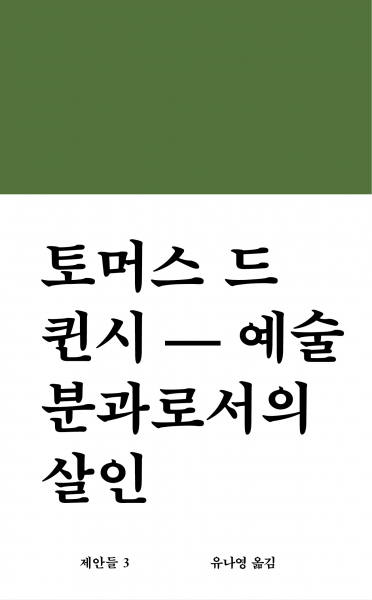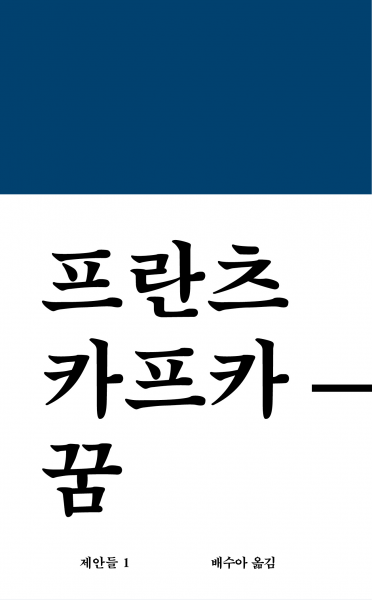“우리가 진지하게 한 이야기들은 잘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담 삼아 한 이야기들은 오래 기억된다.”
이 책은 워크룸 문학 총서 ‘제안들’ 1~7권을 옮긴 번역가들이 주로 번역에 대해 남긴 말들을 추려 엮은 것이다. 대부분 출간 후 마련된 자리인 ‘번역과 말’에서 비롯되었다. 무수히 남은 다른 말들은 ‘제안들’이 완간된 후 다시 엮일 것이다.
발췌
나는 왜 번역을 하는가.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11쪽)
숲을 봐야 파악하기 쉬운 작가가 있고, 나무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완벽히 전자였다. 숲 전체를 조망하고 나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서 시작했는 데도 자꾸 헤맸다. 굉장히 애를 먹었다. (12쪽)
나는 이 사람을 잘 안다는 말을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리무중의 작가… 잡히지 않고, 항상 도망가고, 그런데 또 한없는 매력으로, 쫓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12~3쪽)
번역은 독서다. 내가 알고 있는 독서 중 가장 강도 높은 독서다. (16쪽)
번역하는 작품이 머릿속을 많이 차지하니까, 어떤 작품을 옮기고 있느냐가 그 작품을 옮기는 동안의 기분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또는 어떤 계절이나 기분이 작품을 고르게도 한다. 해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이 책을 꺼내들곤 했다. (16~7쪽)
원문이 자신의 몸을 통과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데, 아무도 그 과정을 모른다. 그 비밀은 오직 번역가만이 알고 있다. 그 기쁨은 객관적 대가에 비할 수 없다. (18쪽)
이 사람이 분명 이 순간에 이러한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는 확신이 오는 순간. (19쪽)
글을 쓰려는 이라면,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21쪽)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역자 후기이다. (28쪽)
출발어에 대한 충실함과 도착어의 창조적 독립 사이에서 많이 갈등하는 편이냐고 묻는다면, ‘충실함’의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다. 단어 하나하나를 품사 그대로 옮기고 문장 구조와 어순을 보존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칠게 말해, 한 문장 단위에서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옮겨졌다면 충실한 번역이라고 본다.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번역할 때 문장을 해체해서 재조립하는 일은 드물다. 사실 그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체가 주는 느낌까지 전달해주어야 할 텐데, 그런 의미의 충실함을 전제한다면, 나는 창조적 독립보다는 충실함 쪽으로 확실히 더 기운다. 이건 전적으로 번역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문제다. 내 경우, 자신에게 번역‘가’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직은 낯간지럽다. ‘나는 편집자와 협업하여 책을 만드는 스태프의 일원으로서의 번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번역도 내 개성을 최소한으로 드러내고 저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작업하려고 노력한다. (29~30쪽)
일단 몇 페이지를 본 후, 외부 자료는 일체 읽지 않고, 이 작가가 글을 썼을 때의 맥락을 재구성해 보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작가가 글을 쓸 때 했을 복잡다단한 생각들과 더불어, 외부적 조건들까지. 작가가 글을 쓸 당시의 내면과 외부적 조건들을 아우르는 상황을 구성하면서 옮기려 한다. (30쪽)
번역이 좋다? 원문을 해당 언어로 읽지 못했는데, 어떻게 번역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번역문’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내가 읽을 때 잘 이해되면 ‘좋은 번역’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 ‘좋은 번역’이란 번역이 가져오는 이질감 내지 이물감에서 비롯되는 장점과 매력을 죄다
없애버리고, 단지 먹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일 수 있다. (33쪽)
독자로 머물렀을 때가 행복했다. 그때는 하룻밤에 한 권, 혹은 두 권까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자꾸 뜯어보게 된다. (34쪽)
말 속의 침묵. 말 속에 침묵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에 어떻게 침묵을 들일 것인가. 말이 끝나서 당연히 남는 침묵이 아니라 말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침묵. 자신의 모국어를 버리고 자신을 불구로 만드는 외국어 속으로 들어가 글을 쓰려고 했던 작가가 말하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니 정말 어리석지 않은가… 애초부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또 침묵을 배운다고 하는… 참으로 무모한 소임을 자임하는 일. “진정한 시인은 자기 고향 말을 잃어버려야 한다”던 17~18세기 문인 비코. “작가는 자기 말을 일부러 잃어버려야 하는 사람”이라던 프루스트. 그들은 왜 자기 말을 잃어버리라고 했을까. (37~8쪽)
시는,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시도할 수 있는 끝인 것 같다. 번역의 본질에 가장 저항하는 것이 시이다. 번역은 풀어서 쓰고 넓혀서 쓰게 되는데, 시는 그러한 산문의 논리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의 마지막 단계에 놓이는 것 같다. (40~1쪽)
잘 찍은 사진은 확대할수록 정밀한 세부들이 드러난다. 잘된 번역도 그럴 것 같다. (41쪽)
차례
이 책에 대하여
번역과 말
지은이
김예령, 김한민, 배수아, 성귀수, 엄지영, 유나영, 최애리
편집
김뉘연
디자인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