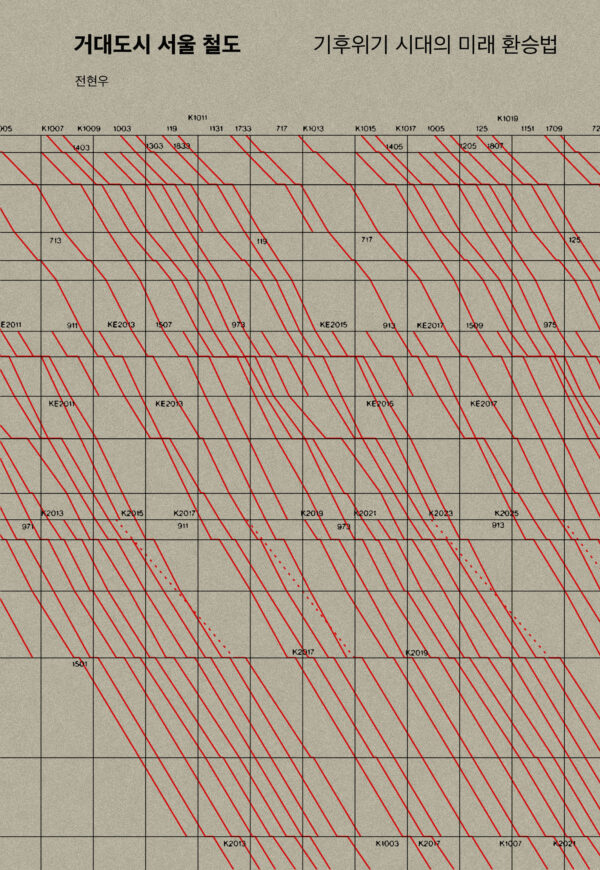『초조한 도시, 두 번째』는 기계비평가 이영준이 개발과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을 반복하며 재난에 맞먹는 규모와 속도로 변하는 도시와 그 주변 모습을 13년의 시차를 두고 담아낸 스냅숏이다. 나날이 커지고 나날이 높아지는, 모든 것이 아파트로 귀결되는 도시의 밀도가 가하는 압력에 맞서 도시를 살아갈 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저자가 선택한 기록의 방식이자 결과물이다.
초조한 도시를 괄호에 넣다
한국의 도시는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의 장소다. 오늘 멀쩡하던 건물이 내일이면 철거되고, 내일 세워졌던 건물은 몇 달 후면 바로 옆에 세워진 더 높은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밀도는 더 이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얼마나 많이 바뀌냐가 아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도시의 빠른 유속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매일 괴로워하며 도시를 살아가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도시의 초조함을 소화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괄호에 넣어버린다. 저자에게는 카메라가 바로 도시의 초조함을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이다. 즉, 그의 목적은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려는 것도 아닌, 도시를 살아내기 위함이다.
일단 카메라에 담긴 도시는 무해한 것으로 바뀐다. 현실에서 압력을 가했던 도시의 밀도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읽어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도시를 읽어내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책이나 영화 같은 일반적인 ‘읽기’의 대상과 달리 도시에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출간된 전작 『초조한 도시』와 비교할 때, 이번에 출간된 후속판은 도시를 읽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저자가 말하는 밀도와 고도, 무엇보다 속도가 즉각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같은 자리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몇몇 사진들은 저자가 한국의 도시 경관을 한마디로 압축한 “기승전아파트”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한다. 고도의 측면에서는 2016년 완공된 롯데타워(높이 555미터)가 상징적이다.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의 높이(부르즈 할리파 828미터)가 이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북한산(높이 836미터)에 근접한 현재,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자연경관이 아닌 인공물이 차지한 지 오래다.
결국 이 책에 실린, ‘빛 충동’에 빠진 한 비평가가 지난 20여 년간 찍은 사진들은 의도치 않게 역사성을 띤다. 그 역사는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거나, 정교한 담론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서의 역사다. 괄호 안에 얌전히 보관하는 대신, 다시 괄호 밖으로 꺼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폐허 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비참한 기분으로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도시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폐허는 계속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꼭 거창한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을 세워야 도시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도시의 구석구석에 써서 채워 가는 작은 의미—추억, 흔적, 행위, 정보—들을 통해 도시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발췌
나는 한국의 도시 기호들을 사진 찍음으로써 거리를 둔다. 수잔 손탁이 ‘참여하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사진 찍음으로써 도시의 기호 세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들에 대해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 혼잡의 힘을 즐긴다. 카메라의 망원렌즈는 나에게 기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멀리서 기호들이 중첩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전 처음 한국의 도시에 와 본 사람처럼 놀란다. 그리고 놀라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듯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다. (27쪽)
도시에서 마주치는 기호들의 의미가 다 해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원래부터 난해해서, 어떤 것은 빛이 묘해서, 어떤 것은 평소에 보지 않던 관점에서 봐서, 어떤 것은 그저 그 순간이 묘해서 해독의 그물을 빠져나간다. 매일 지나다니며 보던 같은 전봇대도 기분에 따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떤 기호가 해독이 안 되면 당혹해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소중한 순간이다. 목적과 기능에 묶여 있던 사물들이 족쇄를 풀어 버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요즘 신유물론이라는 철학이 대유행인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다. 사물의 얘기를 듣자는 것 아닌가. (95쪽)
‘초조한 도시’는 망원렌즈의 눈으로 도시를 재구성해서 본다. 그것은 수사법으로 치면 과장법인데, ‘빌딩들이 많다’고 말하는 식이 아니라, ‘빌딩들이 진짜로 너무 많아서 숨이 콱 막혀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객관적인 중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어느 쪽으론가 치우쳐 있으므로, 과장식 수사법은 어떤 면은 놓치게 되지만 또 다른 면은 확실하게 보여 준다. ‘초조한 도시’가 과장해서 보여 주는 것은 도시의 밀도와 고도, 그것들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리듬감, 나아가 도시의 위태로운 에너지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다 폭발해서 모두가 분해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에너지 말이다. (121쪽)
도시를 만드는 주된 물질이 콘크리트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콘크리트를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삭막한 콘크리트라고 저주하면 우리는 콘크리트가 만든 문명의 붕괴와 함께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콘크리트는 없앨 수도, 그 표면을 장식하여 속을 가려 버릴 수도 없다. 콘크리트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려 한다. 이제는 콘크리트를 직접 만나야 하지 않을까? (257쪽)
도시가 초조한 이유는 단지 시간에 쫓겨서만이 아니라 시간을 밀어붙이는 갈등과 압력의 밀도 때문이다. 우이암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웃듯 고고히 서 있다. 우이암을 오른 산악인들은 초조한 도시를 초월해 있다. 물론 그들도 하산하면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디지털 사진 속에서 그들은 초조한 도시를 초월한 등반가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324쪽)
후속판 서문
초판 서문
1장 기호의 제국
사물이라는 기호
아인스월드라는 세계
글씨의 제국
삭막미
X의 세계
2장 밀도와 고도
밀도의 사물들
도시 경관이 된 북한산
롯데타워 지우기
벚꽃의 추억
살풍경
시간의 도시
해양도시의 아이러니
3장 콘크리트에도 격이 있다
콘크리트, 신전이 되다
크리트, 자연이 되다
콘크리트, 전쟁이 되다
콘크리트, 빛이 되다
에필로그
이영준
기계비평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교양학부 교수. 기계의 메커니즘과 존재감이 가지는 독특한 아름다움에 끌려 기계를 비평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 그 결과물로 『기계비평: 한 인문학자의 기계문명 산책』(2006), 『페가서스 10000마일』(2012), 『조춘만의 중공업』(공저, 2014), 『우주 감각: NASA 57년의 이미지들』(2016),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공저, 2017),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공저, 2017), 『푈클링엔: 산업의 자연사』(공저, 2018) 같은 저서를 썼다. 또한 대우조선에 대한 전시인 『기업보고서: 대우 1967–1999』(공동 기획, 2017), 발전소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전시인 『전기우주』(2019), 조선 산업에 대한 전시인 『첫 번째 파도』(공동 기획, 2021), 『두 번째 파도』(공동 기획, 2022) 등 기계와 산업에 대한 전시들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