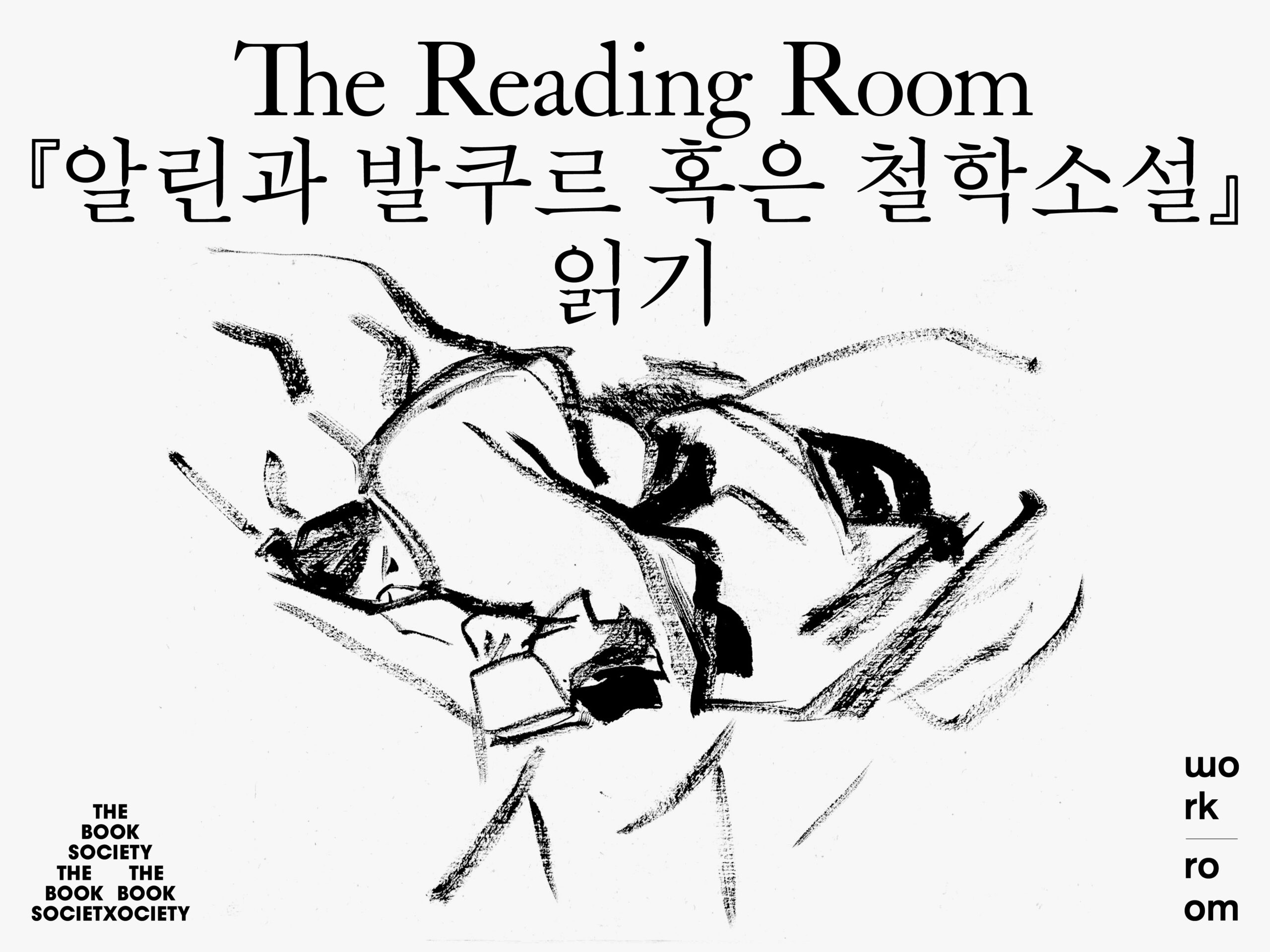작품을 분석할 때 원전(原典, canon)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원전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당 텍스트에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이야기의 가치(story value)를 판단할 때 원본(原本, original)에 대한 확정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내가 분석하려는 텍스트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 SF는 이런 기본적인 작업이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초기 발표작들에 대해서는 이 작품이 창작인지, 번역을 한 것인지, 번안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작품들이 여전히 많다. 이는 한국 SF가 그동안 문단이나 학계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목에 번역자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어도 원작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창작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원작을 밝히지 않은 번역물이거나 번안물인 경우도 하나둘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첫 SF라 할 수 있는 「해저여행기담」(1907)이 소개된 지 100년도 더 지난 이제야 말이다.(주 1)
김교제의 「비행선」(飛行船)은 그중에서도 전자, 즉 번역임을 밝혔음에도 원작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소설 작가 김교제의 첫 번째 번역 소설이자 세 번째 발표작인 「비행선」은 판권지에 ‘역술자 김교제’(譯術者 金敎濟)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창작으로 추정하거나, 번역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원작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주 2) 이후 명확한 증거 없이 쥘 베른의 「기구를 타고 5주간」(Cinq semaines en bllon, 1863)을 번역한 작품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표지에 있는 비행선 자체가 주는 인상 때문이기도 했고,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당시에 비행선을 타고 모험하는 이야기 정도를 유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정확한 상태의 정보가 고장원의 『세계과학소설사』에 실리면서 한동안 한국 SF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줄곧 그대로 인용되어 왔다.(주 3) 그러다가 2010년 김종방의 연구에서 인명을 표기하는 방식이나 공간과 배경의 상이함 때문에 이 작품의 원작을 「기구를 타고 5주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김종방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쳤을 뿐, 원작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원작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주 4)
결국 「비행선」의 원작이 『뉴 닉 카터 위클리』(New Nick Carter Weekly)라는 미국의 다임 노블(diem novel) 잡지에 연재된 ‘탐정 닉 카터’(Detective Nick Carter) 시리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임이 밝혀진 것은 2011년 강현조의 연구에 와서의 일이다. 강현조는 ‘일창’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글에서 처음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데, 블로그 포스팅에는 해당 작품의 서지 사항과 내용만 요약되어 있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 국제문학문화학부 한국학과 양윤선 교수를 통해 사본을 입수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주 5)


그 결과 김교제의 「비행선」은 ‘탐정 닉 카터’ 시리즈 중, 프레더릭 데이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대면: 혹은 닉 카터의 실수 연발의 날』(Facing an Unseen Terror: Or, Nick Carter’s Day of Blunders)과 『아이다야, 미지의 여인: 혹은 닉 카터의 4중고』(Idayah, the Woman of Mistery: Or, Nick Carter’s Fourfold Problem), 『제왕 만들기: 혹은 닉 카터 생애 최대 미스터리에 직면하다』(The Making of a King: Or, Nick Carter Faces His Greatest Mystery), 『여신의 제국: 혹은 닉 카터의 놀라운 모험』(The Empire of a Goddess: Or, Nick Carter’s Wonderful Adventure)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며, 앞서 김종방이 「기구를 타고 5주간」이 원작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던 공간적 배경 또한 미국 뉴욕과 네팔로 이 작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했다.(주 6)
뿐만 아니라 강현조는 김교제가 영어 원작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판본을 중역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구를 진행해 ‘미해특성기보사’(尾楷忒星期報社)라고 원저자를 표기하고,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번역해 출판한 『신비정』(新飛艇, 1908)이 그 저본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비행선」이 발표된 지 100년 만에 원작이 제대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주 7)
이후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행선」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최애순은 「비행선」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각도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중에서도 비행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애당초 탐정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가 과학소설로 편입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주 8) 탐정이 등장해 논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모험을 벌이는 장르적 특징보다는 비행선이라는 서구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오브제가 부각되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행선』은 ‘과학소설’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여기에서 비행선은 구한말 서구 문물 혹은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겼던 과학기술 혹은 과학적 원리에 대한 환상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주 9) 닉 카터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사를 이끄는 내재적인 요인 이전에, 그들이 비행선을 타고 이동해 다닌다는 일종의 환상적이고 마법적인 영역, 하지만 근대화라고 불리는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표현에 더 관심이 갔던 것이다. 그러기에 황당무계한 상상과 탐정 소설적이고 모험 소설적 요소에 제국주의적 편견이 결합되었다는 『비행선』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학소설이라는 표제가 붙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주 10) 당시의 독자들에게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비행선이나, 닉 카터가 뉴욕 기마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과학 기구들은 그 자체로 근대화로 대표되는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소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면면을 확인하면 이 시기에 닉 카터의 소설을 번역하고 비행선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소설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근대화로 표상되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합리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일종의 계몽 도구로서의 필요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셈이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연구와 증명을 위해서는 정전을 수립하는 작업이 확실히 중요하다. 「비행선」에 대한 해석들 역시 정전이 증명된 2011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0여 년 동안이나 원작의 자리를 공백으로 남게 한 사회 문화적 배경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서, 2011년 이후로도 해당 내용들이 바로잡히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김교제에 대한 정보와 소설 원문을 찾으려 했지만 ‘김교제’로 키워드를 입력해도 소설 원문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에 분명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열람실에서 해당 자료를 접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재차 ‘비행선’으로 검색을 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비행선’이란 키워드보다는 열 편의 작품만 발표했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김교제’라는 저자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접근성이 더 좋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반대였다. 의아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지 사항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저자명이 김교제(金敎濟)가 아니라 김효제(金孝濟)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주 11)
작은 단체나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에서 이런 데이터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해당 텍스트나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적을뿐더러, 이를 찾는 사람들도 한정적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러한 오류들은 진입 장벽을 높인다. 담론의 시작 지점을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이러한 일들이 점차 줄어들어 한국 SF의 정전들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될 수 있는 좀 더 큰 단위에서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만으로는 연속성이나 긴밀함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연구자들이 모여 집단 연구를 통해 정전을 수립하고 일종의 대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한국 SF 텍스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르 문학, 혹은 대중 문학으로 분류되는 영역 중에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SF나 추리, 로맨스의 상당 부분이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수집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무협이나 판타지 장르 역시 그 도입 시기와 변용의 역사들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정리되지 않고, 개별 연구자의 성과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장르는 1990년대 PC 통신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장르문학들의 원전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연구와 다양한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들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주
1. 이 글의 주제인 「비행선」의 원작 문제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한 것은 2015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웹진 『크로스로드』 10주년 SF 페스티벌에서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가 했던 「한국 과학소설의 서지」라는 강연을 통해서였다. 당시에는 메모만 하고 지나쳤는데,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상준 대표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고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강현조의 연구를 제공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박상준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2. 유병석, 「김교제의 작품」, 『신문학과 시대의식』(서울: 새문사, 1981), 1–96; 최원식, 「이해조의 계승자, 김교제」, 『민족문학사연구』, 2권 1호(1992): 208–231.
3.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서울: 채륜, 2008), 385.
4. 김종방, 「한국 과학소설의 성립과정 연구」(석사논문, 세종대대학원, 2010), 57–62 참조.
5. 강현조, 「김교제의 번역‧번안 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현대소설연구』, 48집(2011): 197–225 참조.
6. 같은 글, 204 참조. ‘탐정 닉 카터’ 시리즈를 포함한 『뉴 닉 카터 위클리』에 대한 서지 사항과 원문은
북일리노이 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타깝게도 「여신의 제국: 혹은 닉 카터의 놀라운 모험」은 누락되어 있다.)
7. 같은 글, 206–207 참조.
8. 최애순, 『공상과학의 재발견』(파주: 서해문집, 2022), 35 참조.
9. 같은 책, 44–49 참조.
10. 최원식, 「이해조의 계승자, 김교제」, 212 참조.
11. 이후 도서관 측에 정정 요청을 해 바로잡았다.
문화 평론가, SF 연구자. 『한국 SF의 스토리텔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 『한국 SF 장르의 형성』이, 공저로는 『비주류 선언』, 『SF 프리즘』, 『인공지능이 사회를 만나면』, 『인류세 윤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