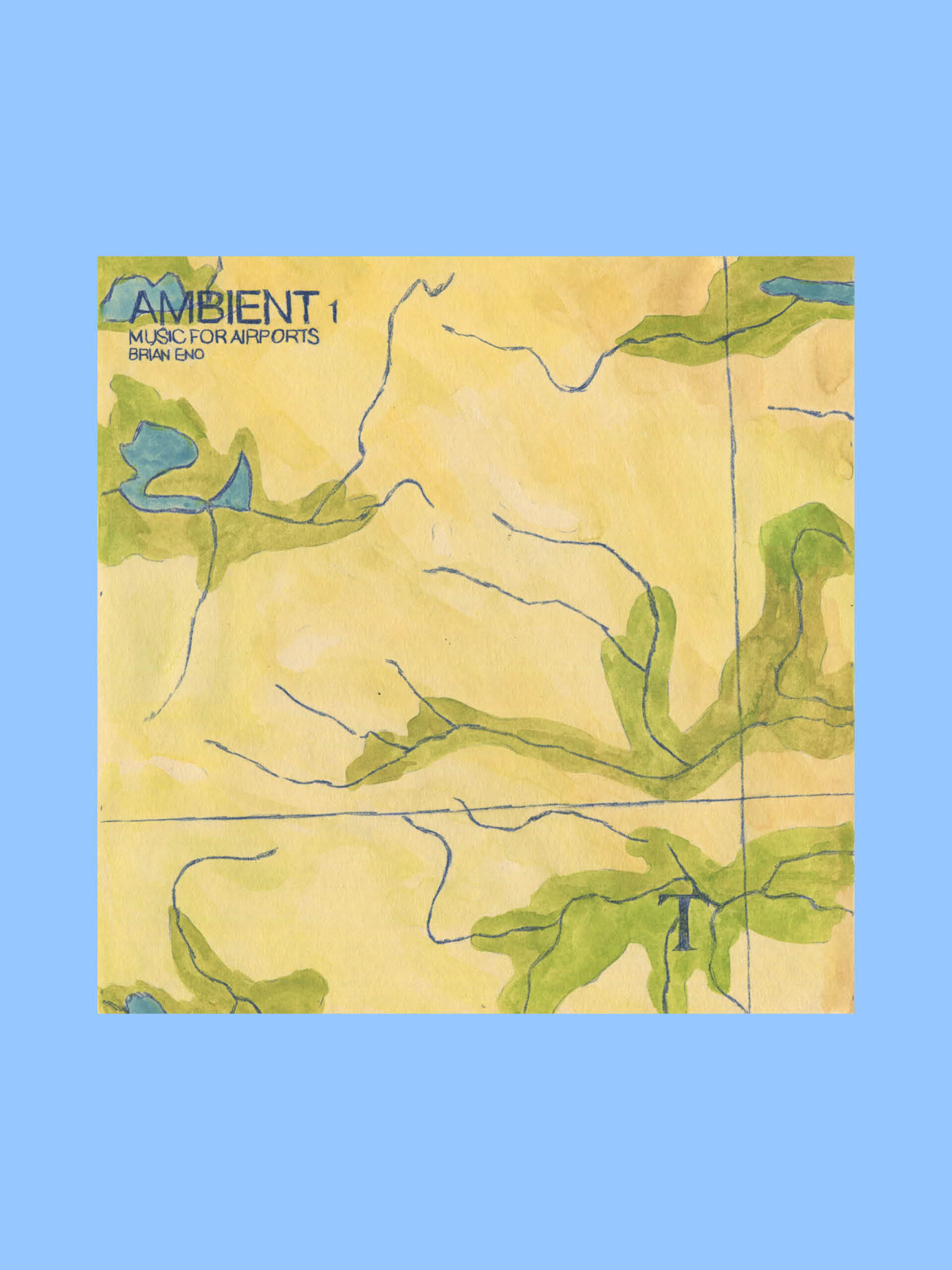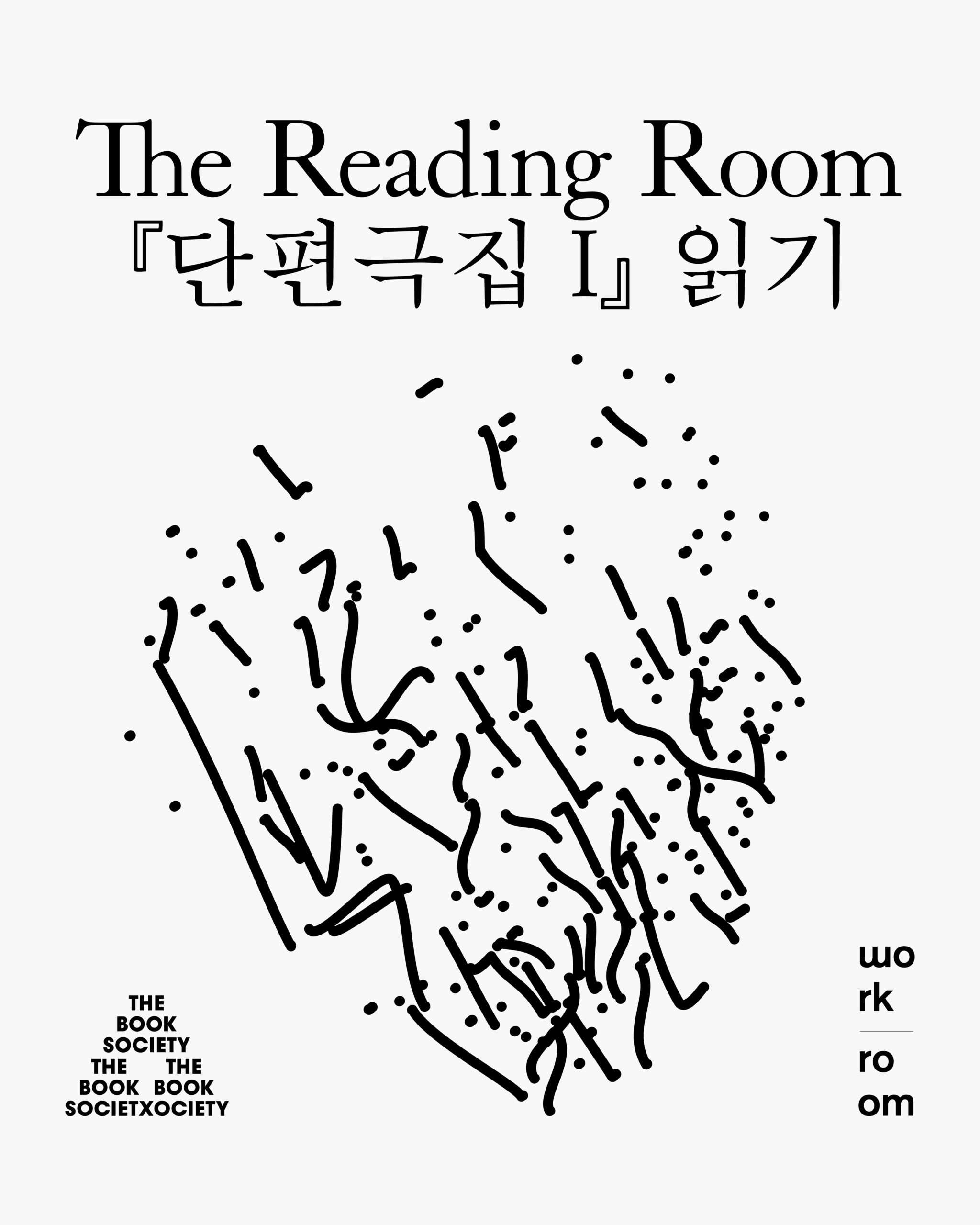브라이언 이노
앰비언트 1: 공항을 위한 음악
EG, 폴리도어 레코드
1979년
공항을 떠올리면, 각 나라의 공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같다. 어느 공항으로 가도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항’이 바로 그 ‘나라’이니까. 서로 다른 공항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커다란 창밖으로 커다란 비행기가 늘어서 있고 흡연실에는 다르게 생긴, 그러나 같은 피로를 느끼는 얼굴들이 자기 나라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곳.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위한 일련번호가 적힌 여권을 손에 쥐고 있다. 누구든지 간에. 그게 정말로 누구든지 간에.
검열을 위한 공간. 정치와 자본이 결탁한 공간. 국가와 국경이라는 관념을 활성화하는 공간. 개별 공항 간의 차이점보다 유사성을 먼저 감각하게 되기에 화이트 큐브와 닮아 있다고 느껴지는 공간. 비어 있는 듯하지만 모든 것은 그곳에 있다.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임시적인, 경유되는, 수단으로서의 공간, 그러나 그로써 하나의 정취를 지닌 장소를 ‘공항적이다’라는 수식어로 부를 수도 있을까.
공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모두 그러려니 한다. 냄새가 나도. 오십킬로그램짜리 배낭을 메고 있어도. 양말을 벗고 드러누워도. 공간의 극대화된 정치성 아래에서 오히려 개별적인 익명으로 머물기 용이하기 때문일까. 낯선 얼굴들이 들어차 있는 이곳에서 나 역시 낯섦의 일부로 섞여 들어간다. 마중하고 배웅하는 얼굴들이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다. 사람은 바뀌지만 만남과 이별의 순간은 반복된다. 공항에서 존재의 상태는 유지되기보다 변화하고 그 모든 격변을 품기에 공항은 충분히 넓다.
『앰비언트 1: 공항을 위한 음악』(Ambient 1: Music for Airports)을 듣고 있노라면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는 공항의 공간적 특수성이 앰비언트라는 장르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오래전에 이미 알았던 것 같다. 우리 같이 공항 걸을까. 이런 말은 공항과 어울리지 않지만 한 번쯤 누군가에게 건네 보고 싶은 말이다. 같이 공항에 가자. 다른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공항에. 오로지 공항에 가기 위해 공항에.
참고
시인.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시집 『나이트 사커』 『세트장』 『싱코페이션』, 산문집 『미지를 위한 루바토』 『시차 노트』 등을 썼다.